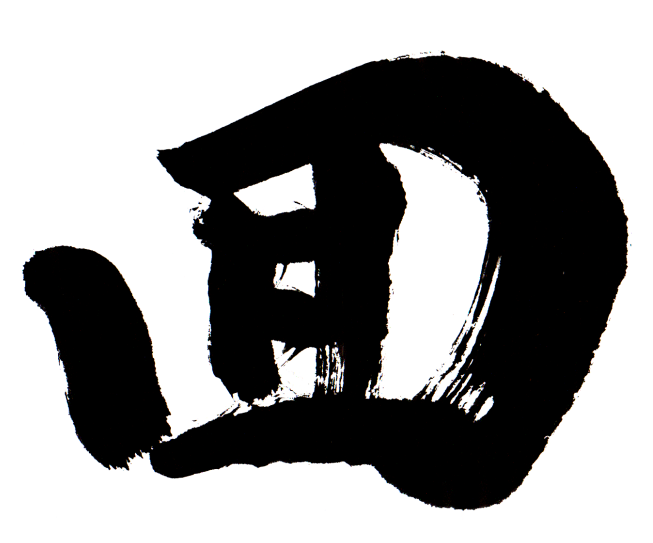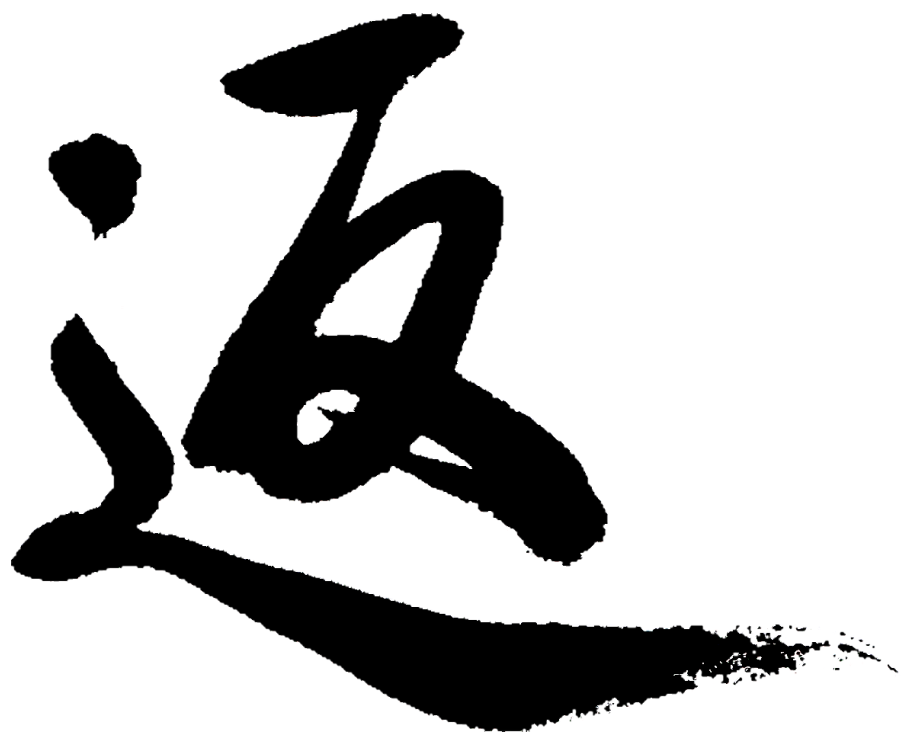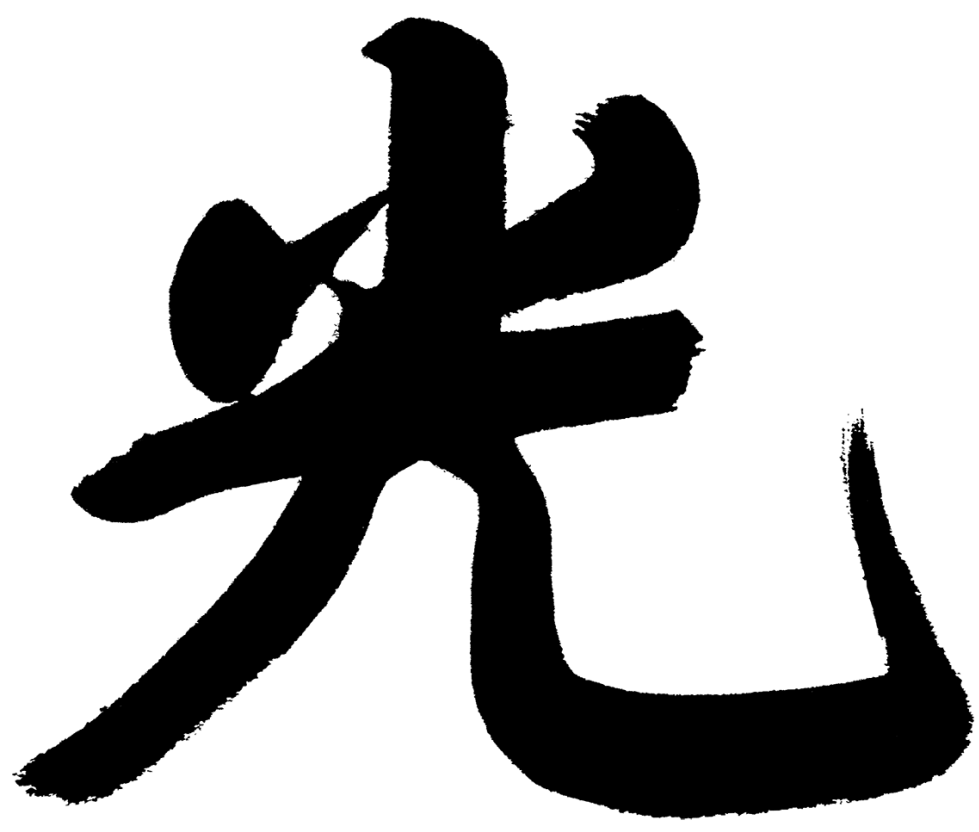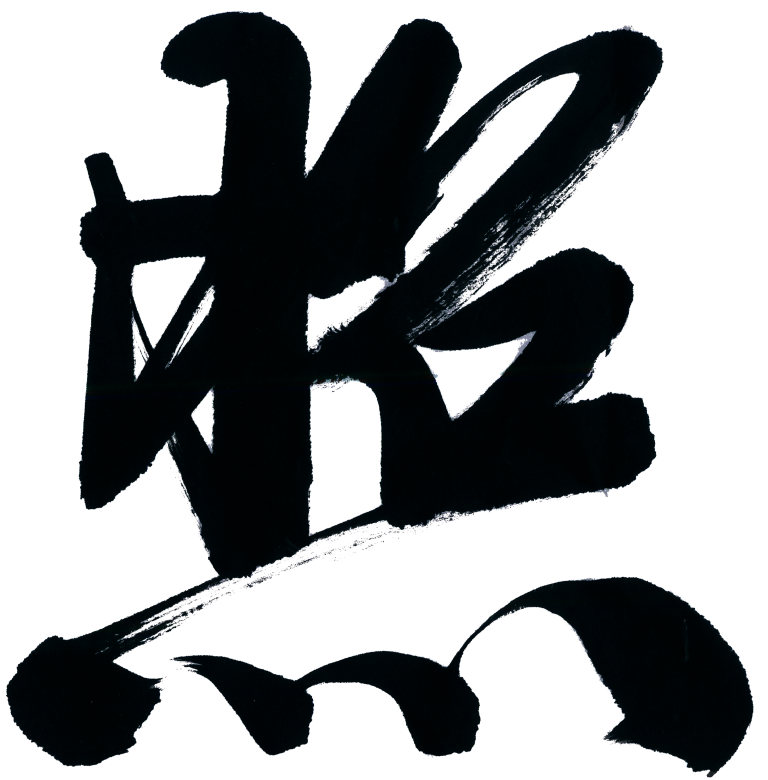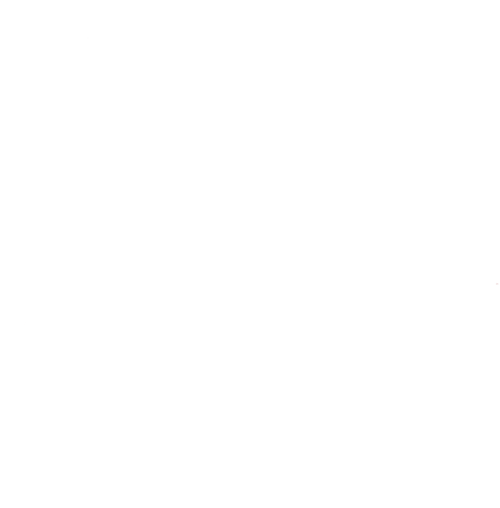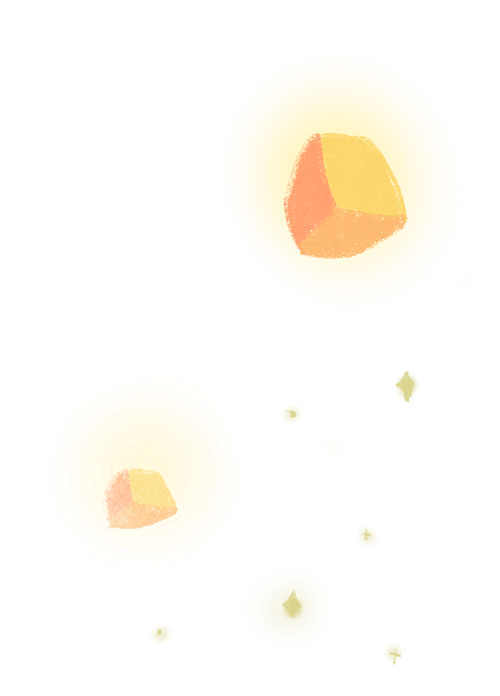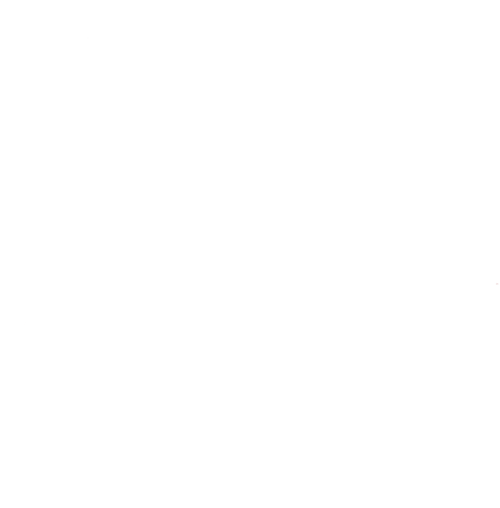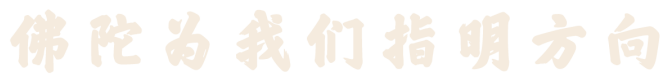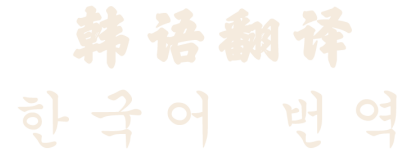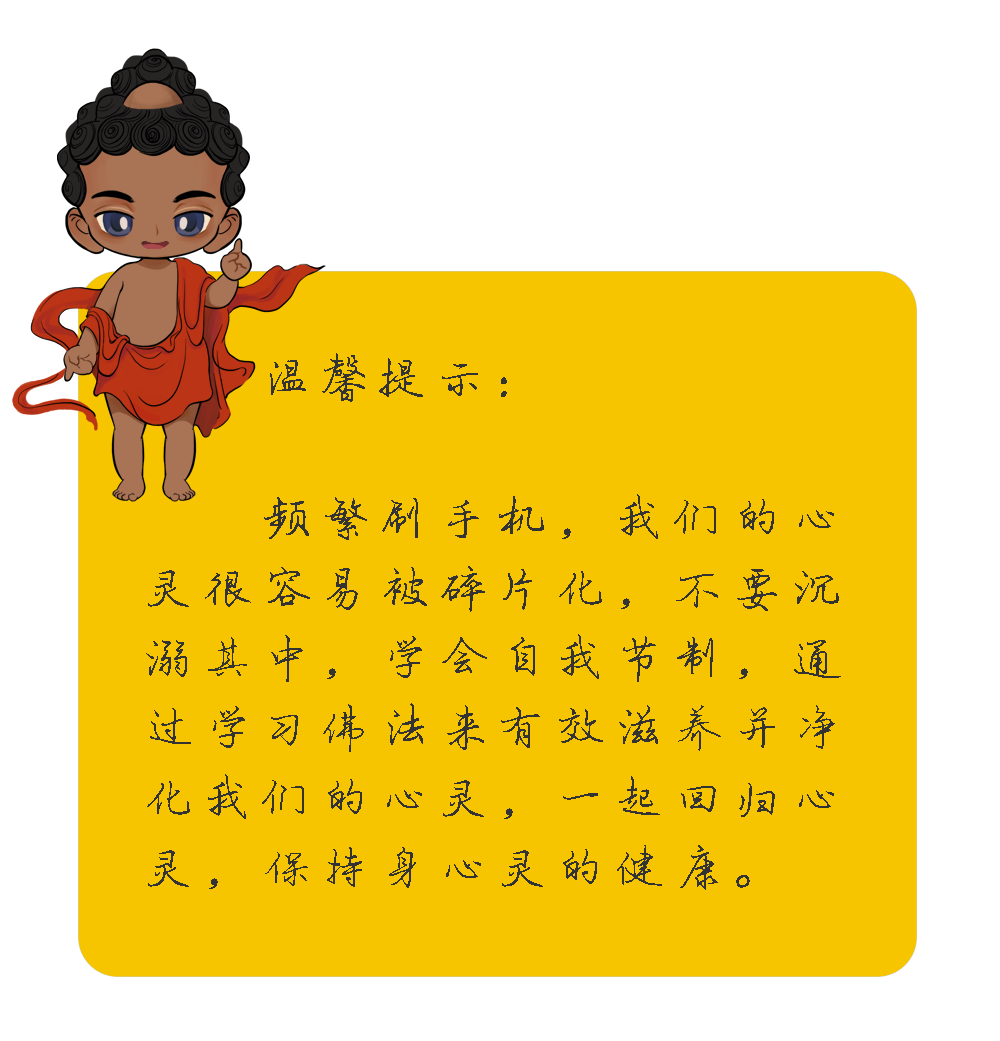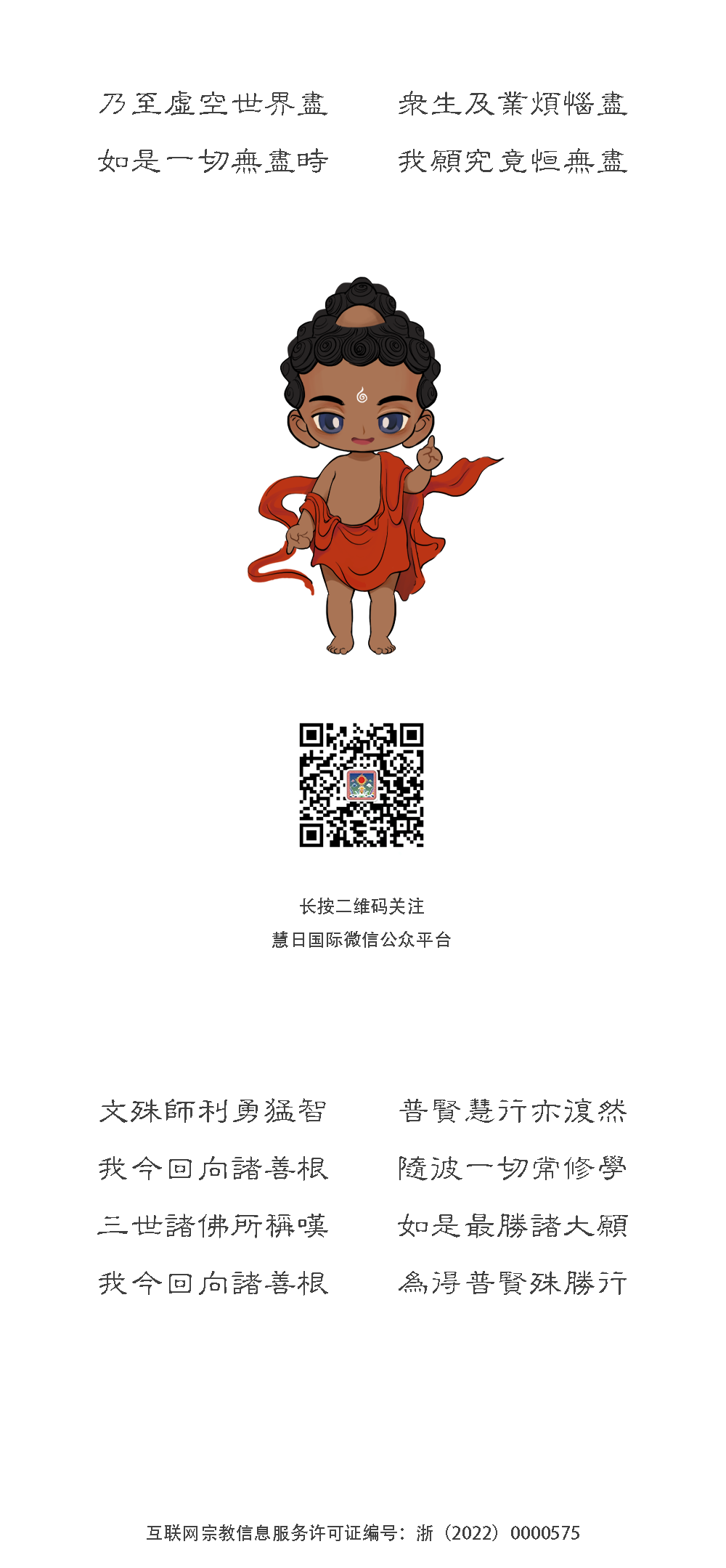각성의 빛으로 파편화된 삶을 비추는 법을 배우자
우리는 현재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고 분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매일 밥 먹고 잠자는 짬시간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꾸미기 좋아하는 소녀가 손거울을 지니고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정신을 불교 수행 방식에 비유하자면 바로 '회광반조(迴光返照: 자신의 본성을 비추어 보다)'입니다.
회광반조(迴光返照)는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염불을 입으로는 읊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얼마든지회광반조하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회귀(迴歸), 즉 돌아온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無量光無量壽)'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무량광무량수'입니다. 비록 몸은 3차원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내면을 돌아보는 회광반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면, 점차 생명이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신비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에 기쁨이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고통마저 기쁨으로 변하여,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법희선열(法喜禪悅)'이라고 합니다.
수행자는 항상 회광반조를 통한 정지정각(正知正覺), 즉 올바른 인식을 유지합니다. 비 수행자는 회광반조를 몰라서, 업에 따라 움직이며, 마음은 점점 쇠약하고 메마릅니다. 물질세계가 아무리 풍족하여도 마음이 척박하다면 찾아온 행복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기쁨마저도 고통이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의식주 환경에 처해 있어도 수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최종 결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무량광무량수"가 우리 마음의 본질이라면, 그 마음의 본질은 부처의 몸에서 이미 극한으로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이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 앞에서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사람, 돼지, 개는 제각기 갖고 있는 복덕이 달라서, 다른 옷을 입은 것뿐입니다. 불교의 생명관은 평등하고 자비로우며 지혜롭습니다. 잘 지켜 나가기만 한다면 생명은 부처님처럼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귀의"는 불교를 배우는 첫 관문으로, 이제 자신이 신앙을 갖고 불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계"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서, "오계"를 수계합니다. 이러한 기초 과정은 불교입문에 매우 중요한데, 일단 몇 년 동안 교리를 잘 배워서, 교리 자체가 우리의 지혜를 이끌어내게되면, 이때 교리를 탐구하여 수련하는 것이 바로 '경(經)'입니다. “경(經)은 올바른 길이다(經者,徑也)”라고 하였습니다. 이 올바른 길을 따라간다면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없이는 살 수 없듯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 불제자로서 법신혜명(法身慧命: 영원한 법신의 지혜)의 '법유(法乳)'와도 같습니다. 법유는 법신혜명을 자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리는 우리의 법신혜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삶의 품질을 높이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각성의 빛(光明)으로 자신의 파편화된 삶을 비추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